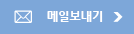세계화가 가져온 불만: 작동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셉 스티글리츠 작성일01-11-30 00:00 조회788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세계화가가져온 불만.hwp
(51.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8-07-04 12:57:18
세계화가가져온 불만.hwp
(51.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8-07-04 12:57:18
본문
특별히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세계화에 저항하는 세계적 운동인데, 이 운동은 가장 최근에 무역협상의 새로운 라운드가 개최된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일어난 저항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운동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저항이 최근 봄 워싱턴에서, 9월 프라하에서 일어났고 세계화에 관한 다양한 측면과 (세계화가) 선진국의 빈민과 특히 개발도상국 빈민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사실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저항자들의 주장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제기되어온 근본적인 불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앞으로 제시하려는 중심적인 주제는 세계화가 빈민과 빈국에 매우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과 특히 빈민들에게 영향을 준 지난 세기 마지막 25년의 세계화는 그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재고할 필요가 있고 재고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세계화의 잠재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에 반대하는 저항자들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말해왔고, 후진국의 희생을 통해 선진국에, 빈자의 희생을 통해 부자에게 이익을 준다고 말해왔다. 그들은 이 시스템은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않다고 말해왔다. 그들은 일반적 이익이 무시되고 특정한 이익을 대변하며 심지어 더 많은 선진국의 이익조차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해왔다. 주요 혜택을 얻는 것은 선진국 내 특정한 이익집단이다. 그리고 이 주장은 세계화가 진행해온 과정, 제시되어왔던 정책들이 보다 넓은 이익집단이 아닌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견해를 가진 특수한 이익집단과 결합되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많은 커다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성이 떨어지는 많은 다른 불만들이 이 주장과 혼재되어 있다. 대중집회가 있을 때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집회가 흥미를 끈다는 것도 사실이며 몇몇 사람들은 기술발전이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시장이 개방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보호무역정책을 원하는 현대판 기계파괴운동(luddites)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불평과 혼재되어 있는 약간의 정당하지 못한 불평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근본적인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또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장소로는 거리에서의 저항운동이 적당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단지 거리의 저항자들의 목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몇몇 가치와 관심에 대해 말하는 것이며 정치지도자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어떻게 방금 설명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충분히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저항자들이 실제로 크게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재고가 있었고 저항자들은 선진국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보도하데 많은 관심을 가지는 대중매체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다. 저항운동이 여론을 움직이고 논쟁의 방향을 바꾸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선거에 당선된 지도자들과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정상적인 통로가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였다.
내 자신의 견해는 세계화는 매우 강력하고 긍정적인 힘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발전한 동아시아 지역을 관찰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세계화의 혜택에 크게 의존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계화의 이익을 취해왔으며 자신들의 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예로서 중국을 들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두 자리 수의 성장률로 발전해 왔다. 성장의 편익이 크게 확산되어 중국의 빈곤율은 크게 하락했고 짧은 시간에 대부분의 빈민은 세계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빠르게 감소했다. 심지어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일인당 국민소득이 30년 전의 8배 이상을 기록했다. 30년 전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실제로 인도보다 낮았다. 오늘날 한국은 OECD회원국이며 주요 경제국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들 나라의 성장률이 수출(미국, 유럽으로의 수출)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세계화, 세계시장이 제공한 기회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나라들은 세계의 나머지 나라와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그들은 IMF와 다른 국제금융기구가 만든 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이 동아시아의 성공과 세계의 나머지 나라들의 실패 사이의 중요한 차이다.
내가 제시하려는 두 번째 주제는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진 실패가 세계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결정해온 세계적 결정이 주로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며 특정한 이익을 반영하는 국제기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결과는 시스템의 통치(governance)가 확립되는 방식에 의해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하나의 방법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교통과 통신비용, 인위적인 무역장벽이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 무역, 자본이동, 지식이동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통해 일반적인 용어(generic term)로 세계화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화는 많은 차원(자본, 노동, 지식)을 가지게 된다.
사실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저항자들의 주장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제기되어온 근본적인 불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앞으로 제시하려는 중심적인 주제는 세계화가 빈민과 빈국에 매우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과 특히 빈민들에게 영향을 준 지난 세기 마지막 25년의 세계화는 그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재고할 필요가 있고 재고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세계화의 잠재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에 반대하는 저항자들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말해왔고, 후진국의 희생을 통해 선진국에, 빈자의 희생을 통해 부자에게 이익을 준다고 말해왔다. 그들은 이 시스템은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않다고 말해왔다. 그들은 일반적 이익이 무시되고 특정한 이익을 대변하며 심지어 더 많은 선진국의 이익조차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해왔다. 주요 혜택을 얻는 것은 선진국 내 특정한 이익집단이다. 그리고 이 주장은 세계화가 진행해온 과정, 제시되어왔던 정책들이 보다 넓은 이익집단이 아닌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견해를 가진 특수한 이익집단과 결합되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많은 커다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성이 떨어지는 많은 다른 불만들이 이 주장과 혼재되어 있다. 대중집회가 있을 때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집회가 흥미를 끈다는 것도 사실이며 몇몇 사람들은 기술발전이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시장이 개방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보호무역정책을 원하는 현대판 기계파괴운동(luddites)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불평과 혼재되어 있는 약간의 정당하지 못한 불평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근본적인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또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장소로는 거리에서의 저항운동이 적당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단지 거리의 저항자들의 목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몇몇 가치와 관심에 대해 말하는 것이며 정치지도자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어떻게 방금 설명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충분히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저항자들이 실제로 크게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재고가 있었고 저항자들은 선진국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보도하데 많은 관심을 가지는 대중매체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다. 저항운동이 여론을 움직이고 논쟁의 방향을 바꾸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선거에 당선된 지도자들과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정상적인 통로가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였다.
내 자신의 견해는 세계화는 매우 강력하고 긍정적인 힘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발전한 동아시아 지역을 관찰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세계화의 혜택에 크게 의존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계화의 이익을 취해왔으며 자신들의 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예로서 중국을 들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두 자리 수의 성장률로 발전해 왔다. 성장의 편익이 크게 확산되어 중국의 빈곤율은 크게 하락했고 짧은 시간에 대부분의 빈민은 세계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빠르게 감소했다. 심지어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일인당 국민소득이 30년 전의 8배 이상을 기록했다. 30년 전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실제로 인도보다 낮았다. 오늘날 한국은 OECD회원국이며 주요 경제국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들 나라의 성장률이 수출(미국, 유럽으로의 수출)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세계화, 세계시장이 제공한 기회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나라들은 세계의 나머지 나라와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그들은 IMF와 다른 국제금융기구가 만든 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이 동아시아의 성공과 세계의 나머지 나라들의 실패 사이의 중요한 차이다.
내가 제시하려는 두 번째 주제는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진 실패가 세계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결정해온 세계적 결정이 주로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며 특정한 이익을 반영하는 국제기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결과는 시스템의 통치(governance)가 확립되는 방식에 의해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하나의 방법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교통과 통신비용, 인위적인 무역장벽이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 무역, 자본이동, 지식이동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통해 일반적인 용어(generic term)로 세계화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화는 많은 차원(자본, 노동, 지식)을 가지게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