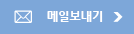미국의 제국주의적 야망과 이라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먼쓰리 리뷰 편집자 작성일02-11-30 00:00 조회861회 댓글0건첨부파일
-
 미국의제국주의적야망과이라크.hwp
(266.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8-07-04 12:54:57
미국의제국주의적야망과이라크.hwp
(266.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8-07-04 12:54:57
본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워싱턴의 이라크에 대한 정책은 공식적으로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이루어지나 또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배치하고 있는 불량국가에 대한 선제공격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미국의 공습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공습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은 자신의 목표를 단지 바그다드 정권의 교체만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더 큰 목표는 중동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미국의 전세계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세계는 현재 제국주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제국주의는 19세기의 그것과는 다르다. 근대적 제국주의의 초기단계에서 독일, 일본, 미국 등 열강은 세계 각지에서 영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무대전면에 등장하였다. 이 시기의 제국주의는 여러 주목할 만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 아프리카를 분할하기 위한 유럽 열강들간의 아귀다툼, 상대국가의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유럽 내에서의 경쟁의 격화, 국제 상품 및 화폐시장의 핵심으로 부상하기 위한 독일의 런던에 대한 도전. 같은 시기에 미국은 유럽시장을 목표로 한 경쟁에 뛰어들었고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 자신의 영향력 하의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제1차세계대전의 주요원인은 열강들이 식민지 및 시장에서 벌인 치열한 경쟁과 독일이 국제 화폐 및 상품시장의 중심에서 영국을 몰아내고자 하는 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는 제국주의의 2단계라고 할 수 있다. 베르사유 조약은 볼셰비즘을 몰아내고자 하는 단일한 목표하에 승자들이 얻은 것을 분할하는 과정이었다. 토스타인 베블렌(Thorstein Veblen)은 지도상에서 볼셰비즘을 없애는 것은 베르사유 조약의 단순히 숨겨진 목표가 아니라 바로 그 조약의 전면에 드러나 있는 목표라고 쓴 바 있다(Essays in Our Changing Order, 1934, p. 464). 그러나 소비에트연방을 고립시켜 붕괴하도록 하는 계획은 대공황에 의해서, 또한 추축국이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위기에서 벗어나 세계체제에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갔다.
제국주의의 3단계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시기이다. 전쟁 중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헤게모니국가로 등장한 미국은 세계경제의 전략적 중심이 되는데 필요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러한 계획은 단지 소련의 존재에 의해서만 제약을 받을 뿐이었다. 노엄 촘스키(Noam Chomsky)는 1981년 11월의 본지 기고문에서 이 시기의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의 형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국제정책의 발생과정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틀은 전쟁과 평화 스터디 프로그램(the War and Peace Studies Program)이 개최되었던 기간(1935-49) 중 마지막 해에 국무부 담당자들과 국제관계위원회가 작성한 문건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 그들은 1941-42년경에 이르러 전쟁이 미국이 전세계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형태로 종결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때 제기된 질문은 “세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였다.
그들은 대영역계획(Grand Area Planning)이라는 개념을 도출하게 된다. 대영역(Grand Area)이란 그들의 정의에 따르면 “전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갖기 위해 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작업의 지정학적 분석은 세계의 어느지역이 (투자와 이윤의 송환에 관해) 개방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시도에서 행해졌다. 다시말해,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가 대내적 변화없이도(이는 시기의 모든 논의와 관련되는 핵심적인 문제였다), 그리고 부나 권력관계의 재분배 또는 구조적인 변형 없이도 번영하기 위해서, 전쟁과 평화 프로그램은 전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데 전략적으로 필요한 전서방세계 및 해체과정에 있었던 옛 대영제국의 지역 및 극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그것은 단지 최소한의 영역이었을 뿐, 최대한의 영역은 전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양극단 사이에서 대영역이 정해졌고, 금융제도와 관련하여 이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가 다루어졌다. 이는 전후(戰後)시기를 통틀어 변함 없이 지켜져 왔던 틀이었다.
유럽 식민지들의 해방과 태평양에서의 일본의 야심의 좌절은 군사력의 뒷받침을 받는 미국자본이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브레튼우즈협정이 제국주의 열강들의 새로운 경제적 틀을 제공해 주고 있는 동안 전세계에 걸친 미국의 군사력 행사 및 비공개 작전은 더 빈번해졌다. 한국 및 베트남 전쟁과, 이란․과테말라 및 칠레에서의 쿠테타, 쿠바정부 전복 시도, 중미와 아프리카에서의 수많은 내전개입 등이 그것이다.
대영역 개념에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중동에 대한 통제력 확보이다. 중동은 옛 대영제국의 일부분이고, 세계 원유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전세계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1950년대에 이 지역에 대한 일련의 공개적, 비공개적 개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 예가 1953년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란의 모사데그(Mossadegh) 정권이 외국소유의 석유회사를 국유화시키자 이를 전복시킨 사건이었다. 그러한 미국의 시도가 성공했음은 확실하다. 1940년에서 1967년 사이에 미국의 회사들은 중동에서의 원유에 대한 통제를 10%에서 거의 60%까지 증가시킬 수 있었다. 반면에 영국은 1940년의 72%에서 1967년에는 30%로 하락하였다(H. Magdoff, Age of Imperialism, p.43).
유럽통합의 지속적인 지연은 부분적으로는 스테그네이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유럽지도자들이 보호장벽을 원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반했을 때는 실현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이 약해지고 일본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결정적인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1990년대 초 유럽에서의 공산주의의 몰락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부분적으로 쇠퇴했던 미국의 헤게모니가 새로운 시대를 구가할 수 있는 길을 닦아주었다.
제국주의의 역사적 진화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워싱턴 정부가 현재 이라크와의 전쟁을 일으키려는 진정한 동기는 이라크에 의한 일반적인 군사적 위협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이제는 그 힘을 자신이 원할 때면 언제든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목적 때문이다. 아틀란타저널회(Atlanta-Journal Constitution)의 부편집장인 제이 북맨(Jay Bookman)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The Presidentꡑs Real Goal in Iraq,ꡓSeptember 29, 2002).
이라크에 관한 공식적인 스토리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 그것(이라크에 대한 침공)은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사담 후세인, 혹은 UN결의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만약 발발한다면 미국이 원숙한 세계제국으로의 공식적인 등장을 통해 지구 경찰로서의 유일한 책임과 권한을 손에 넣으려는 의도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10년 또는 더 많은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계획의 절정이 될 것이다. 그 계획은 ‘적들이 항상 주장해 왔듯이 “미제국주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르지만 미국은 전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장악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로마는 봉쇄정책을 쓰지 않았다. 단지 정복했을 뿐이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물론 현재의 제국주의는 19세기의 그것과는 다르다. 근대적 제국주의의 초기단계에서 독일, 일본, 미국 등 열강은 세계 각지에서 영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무대전면에 등장하였다. 이 시기의 제국주의는 여러 주목할 만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 아프리카를 분할하기 위한 유럽 열강들간의 아귀다툼, 상대국가의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유럽 내에서의 경쟁의 격화, 국제 상품 및 화폐시장의 핵심으로 부상하기 위한 독일의 런던에 대한 도전. 같은 시기에 미국은 유럽시장을 목표로 한 경쟁에 뛰어들었고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 자신의 영향력 하의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제1차세계대전의 주요원인은 열강들이 식민지 및 시장에서 벌인 치열한 경쟁과 독일이 국제 화폐 및 상품시장의 중심에서 영국을 몰아내고자 하는 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는 제국주의의 2단계라고 할 수 있다. 베르사유 조약은 볼셰비즘을 몰아내고자 하는 단일한 목표하에 승자들이 얻은 것을 분할하는 과정이었다. 토스타인 베블렌(Thorstein Veblen)은 지도상에서 볼셰비즘을 없애는 것은 베르사유 조약의 단순히 숨겨진 목표가 아니라 바로 그 조약의 전면에 드러나 있는 목표라고 쓴 바 있다(Essays in Our Changing Order, 1934, p. 464). 그러나 소비에트연방을 고립시켜 붕괴하도록 하는 계획은 대공황에 의해서, 또한 추축국이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위기에서 벗어나 세계체제에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갔다.
제국주의의 3단계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시기이다. 전쟁 중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헤게모니국가로 등장한 미국은 세계경제의 전략적 중심이 되는데 필요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러한 계획은 단지 소련의 존재에 의해서만 제약을 받을 뿐이었다. 노엄 촘스키(Noam Chomsky)는 1981년 11월의 본지 기고문에서 이 시기의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의 형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국제정책의 발생과정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틀은 전쟁과 평화 스터디 프로그램(the War and Peace Studies Program)이 개최되었던 기간(1935-49) 중 마지막 해에 국무부 담당자들과 국제관계위원회가 작성한 문건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 그들은 1941-42년경에 이르러 전쟁이 미국이 전세계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형태로 종결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때 제기된 질문은 “세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였다.
그들은 대영역계획(Grand Area Planning)이라는 개념을 도출하게 된다. 대영역(Grand Area)이란 그들의 정의에 따르면 “전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갖기 위해 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작업의 지정학적 분석은 세계의 어느지역이 (투자와 이윤의 송환에 관해) 개방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시도에서 행해졌다. 다시말해,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가 대내적 변화없이도(이는 시기의 모든 논의와 관련되는 핵심적인 문제였다), 그리고 부나 권력관계의 재분배 또는 구조적인 변형 없이도 번영하기 위해서, 전쟁과 평화 프로그램은 전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데 전략적으로 필요한 전서방세계 및 해체과정에 있었던 옛 대영제국의 지역 및 극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그것은 단지 최소한의 영역이었을 뿐, 최대한의 영역은 전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양극단 사이에서 대영역이 정해졌고, 금융제도와 관련하여 이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가 다루어졌다. 이는 전후(戰後)시기를 통틀어 변함 없이 지켜져 왔던 틀이었다.
유럽 식민지들의 해방과 태평양에서의 일본의 야심의 좌절은 군사력의 뒷받침을 받는 미국자본이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브레튼우즈협정이 제국주의 열강들의 새로운 경제적 틀을 제공해 주고 있는 동안 전세계에 걸친 미국의 군사력 행사 및 비공개 작전은 더 빈번해졌다. 한국 및 베트남 전쟁과, 이란․과테말라 및 칠레에서의 쿠테타, 쿠바정부 전복 시도, 중미와 아프리카에서의 수많은 내전개입 등이 그것이다.
대영역 개념에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중동에 대한 통제력 확보이다. 중동은 옛 대영제국의 일부분이고, 세계 원유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전세계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1950년대에 이 지역에 대한 일련의 공개적, 비공개적 개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 예가 1953년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란의 모사데그(Mossadegh) 정권이 외국소유의 석유회사를 국유화시키자 이를 전복시킨 사건이었다. 그러한 미국의 시도가 성공했음은 확실하다. 1940년에서 1967년 사이에 미국의 회사들은 중동에서의 원유에 대한 통제를 10%에서 거의 60%까지 증가시킬 수 있었다. 반면에 영국은 1940년의 72%에서 1967년에는 30%로 하락하였다(H. Magdoff, Age of Imperialism, p.43).
유럽통합의 지속적인 지연은 부분적으로는 스테그네이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유럽지도자들이 보호장벽을 원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반했을 때는 실현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이 약해지고 일본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결정적인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1990년대 초 유럽에서의 공산주의의 몰락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부분적으로 쇠퇴했던 미국의 헤게모니가 새로운 시대를 구가할 수 있는 길을 닦아주었다.
제국주의의 역사적 진화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워싱턴 정부가 현재 이라크와의 전쟁을 일으키려는 진정한 동기는 이라크에 의한 일반적인 군사적 위협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이제는 그 힘을 자신이 원할 때면 언제든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목적 때문이다. 아틀란타저널회(Atlanta-Journal Constitution)의 부편집장인 제이 북맨(Jay Bookman)은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The Presidentꡑs Real Goal in Iraq,ꡓSeptember 29, 2002).
이라크에 관한 공식적인 스토리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 그것(이라크에 대한 침공)은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사담 후세인, 혹은 UN결의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만약 발발한다면 미국이 원숙한 세계제국으로의 공식적인 등장을 통해 지구 경찰로서의 유일한 책임과 권한을 손에 넣으려는 의도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10년 또는 더 많은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계획의 절정이 될 것이다. 그 계획은 ‘적들이 항상 주장해 왔듯이 “미제국주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르지만 미국은 전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장악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로마는 봉쇄정책을 쓰지 않았다. 단지 정복했을 뿐이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