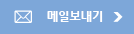꿈의 현실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존 홀로웨이 작성일99-11-30 00:00 조회663회 댓글0건첨부파일
-
 꿈의 현실성.hwp
(64.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8-07-05 11:18:20
꿈의 현실성.hwp
(64.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8-07-05 11:18:20
본문
1. 우리는 사빠띠스따가 던진 도전의 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빠띠스따가 안겨준 도전은 이것이다 : 우리는 어떻게 권력을 잡지 않고서 새로운 세상, 존엄성에 기반을 둔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가?
사빠띠스따는 20세기 혁명의 경험이 남긴 교훈을 명백한 것으로 만들어 왔다. [그 교훈이란] (의회주의적 방법이든 비-의회주의적 방법이든) 권력을 잡고서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 지향성은 국가가 권력(통상적 의미에서의 권력이 아니라 현실을 바람직하게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의미에서의 권력을 말한다 : 역주)이 자리잡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오류이다. 국가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그물망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일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재생산을 촉진하는 일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큰 해악은 권력지향성은 불가피하게 혁명운동 내부에 권력관계를 재생산한다는 점이다. 권력을 장악한다는 사상(의회를 통해서든 다른 수단을 통해서든)은 불가피하게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조직 안에서 계층적인 권력관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도부가 권력 획득이라는 목적에 어긋난다고 간주하는 투쟁이나 행동들은 억제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운동의 목표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 혁명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사빠띠스따가 혁명의 문제를 새롭게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청년들의 그룹로서가 아니라 ‘무장한 공동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을 것이다.(청년들의 그룹으로서만 남아 있었다면 기존 좌파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 역주) 혁명의 문제(다시 말해 인간 존립의 문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권력을 잡지 않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직까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물음은 오직 이것 하나뿐이다.
권력을 잡지 않고 세상을 바꾼다는 사빠띠스따의 외침이 무엇을 뜻하는 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국가의 일부가 되는 데 관심이 없다. 우리는 ‘국가는 복종함으로써 지도한다’는 원칙이 실현되게 만드는 시민사회의 유력한 목소리가 되고자 한다.” 이러한 해석은 그다지 급진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상 복종함으로써 지도하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닐 것이며, 복종함으로써 지도한다는 원리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회는 더 이상 자본주의 사회가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해석도 어느 정도는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을 잡지 않고 세상을 바꾼다는 사상에 대한 보다 급진적인 두 번째 해석은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될 수 있다. “우리는 권력 장악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투쟁은 권력관계를 전면적으로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존엄성의 의미이다. 즉 우리가 권력의 객체가 되지 않는 세상, 아무도 권력의 객체가 되지 않는 세상, 권력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겠다는 외침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빠띠스모(사빠따주의)의 진정한 도전이다.
사빠띠스따는 20세기 혁명의 경험이 남긴 교훈을 명백한 것으로 만들어 왔다. [그 교훈이란] (의회주의적 방법이든 비-의회주의적 방법이든) 권력을 잡고서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 지향성은 국가가 권력(통상적 의미에서의 권력이 아니라 현실을 바람직하게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의미에서의 권력을 말한다 : 역주)이 자리잡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오류이다. 국가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그물망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일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재생산을 촉진하는 일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큰 해악은 권력지향성은 불가피하게 혁명운동 내부에 권력관계를 재생산한다는 점이다. 권력을 장악한다는 사상(의회를 통해서든 다른 수단을 통해서든)은 불가피하게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조직 안에서 계층적인 권력관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도부가 권력 획득이라는 목적에 어긋난다고 간주하는 투쟁이나 행동들은 억제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운동의 목표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 혁명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사빠띠스따가 혁명의 문제를 새롭게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청년들의 그룹로서가 아니라 ‘무장한 공동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을 것이다.(청년들의 그룹으로서만 남아 있었다면 기존 좌파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 역주) 혁명의 문제(다시 말해 인간 존립의 문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권력을 잡지 않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직까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물음은 오직 이것 하나뿐이다.
권력을 잡지 않고 세상을 바꾼다는 사빠띠스따의 외침이 무엇을 뜻하는 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국가의 일부가 되는 데 관심이 없다. 우리는 ‘국가는 복종함으로써 지도한다’는 원칙이 실현되게 만드는 시민사회의 유력한 목소리가 되고자 한다.” 이러한 해석은 그다지 급진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상 복종함으로써 지도하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닐 것이며, 복종함으로써 지도한다는 원리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회는 더 이상 자본주의 사회가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해석도 어느 정도는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을 잡지 않고 세상을 바꾼다는 사상에 대한 보다 급진적인 두 번째 해석은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될 수 있다. “우리는 권력 장악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투쟁은 권력관계를 전면적으로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존엄성의 의미이다. 즉 우리가 권력의 객체가 되지 않는 세상, 아무도 권력의 객체가 되지 않는 세상, 권력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겠다는 외침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빠띠스모(사빠따주의)의 진정한 도전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