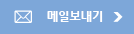[세상읽기]‘노동 기계’로 살라는 시대착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수정 작성일13-11-30 00:00 조회840회 댓글0건본문
[세상읽기]‘노동 기계’로 살라는 시대착오
출처 : 경향신문 9월 17일자
“난 공장이 싫어. 기계가 딱 움직여야지 일하는 거야. 청소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커피 마시는 것도 애들과 잠시 얘기하는 것도 일에 포함되지 않아. 기계가 움직여야지만 일하는 거야. 너무 삭막해서 싫어.”
18년 전, 친구가 진저리치며 말했다. 초등학교 졸업 뒤 서울에 와 봉제노동자로 14년째 일할 무렵이었다. 몸이 아픈 친구는 시간외노동(잔업)을 빠지면 관리자가 눈치를 줘 어쩔 수 없이 일을 관뒀다. 쉬어 몸이 회복되면 다시 일자리를 찾았다. 작업벨 소리가 싫다던, 이제는 연락 끊긴 친구. 10대에 보조원으로 시작해 20대에 재봉사였던 친구는 어느덧 40대 중반일 텐데 지금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까.
얼마 전 한 50대 중반 여성노동자를 만났다. 3년 전에 만났을 때 휴대전화 배터리를 조립했는데 회사만 바뀌고 같은 일을 한다. 그이를 알기 전에는 내가 쓰는 휴대전화 배터리를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방전된 배터리를 갈고 충전기에 끼워놓는 일을 그리 오래, 날마다 하면서도 말이다.
그이의 공장은 아침 9시에 작업 시작 벨이 울린다. 임금은 벨 소리와 함께 기계가 도는 때부터 계산된다. 그런데 실상 출근시간은 오전 8시다. 각자 자기 자리와 맡은 구역을 청소하고 40분간 그날 조립할 물건들을 포장된 상자에서 꺼내고, 몇 가지 라벨 작업을 하는데 이 시간은 품삯이 없다. 회사는 9시 작업 시작 벨이 울리고 기계가 움직일 때부터가 정식 노동이다. 불만스럽지만 노동자들은 그냥 따른다. 파견노동자는 그동안 파견노동자로 전전해 오면서 ‘요구할 수 없음’을 잘 안다. 정당한 걸 요구하다 해고되는 걸 숱하게 봐왔다.
내가 만난 이도 정규직으로 9년 일한 회사가 폐업한 뒤로는 10년 넘도록 지금까지 파견노동자로 일한다. 길게는 2년8개월, 짧게는 5개월 일한 곳도 있다. 스스로 관둔 게 아니다. 3개월 계약서를 한 번 더 쓰고 두 달을 넘길 무렵 회사가 나가라고 했다. 한창 바쁜 봄 수출물량을 채운 뒤, 일감이 줄어드는 여름이 온 것이다.
석 달 뒤 재계약 여부에 전전긍긍하며 일하는 동안, 하루 8시간 정규노동을 마치면 10분 동안 은박지에 싼 김밥 한 줄과 우유 한 팩으로 저녁을 때우고 바로 4시간 시간외노동을 했다. 배터리를 조립하다 다쳐 오른손 엄지손톱이 젖혀져 달랑달랑거릴 때도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앉아 밤 노동을 했다. 배가 아파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일 때도 나흘간 시간외노동을 그대로 하고 더는 버틸 수 없어 하루 결근을 하고 병원을 찾아야 했던 일자리였다.
왜 미련스럽게 그러냐고? 자기 몸이 먼저지 않냐고? 정해진 하루 생산물량을 채우는 게 중요하지 노동자가 다치든, 아프든, 슬프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현장이다. 누가 와서든 물량만 채우면 되지 일이 힘들어 수시로 노동자가 퇴사해도 신경 쓰지 않는 현장이다. 재계약에 영향을 미치니 시간외노동을 노동자가 선택할 수 없다. 눈 밖에 나면 3개월짜리에서도 그냥 하루 만에 잘리는 일자리다.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도 베트남 여성노동자가 배가 아파 병원에 가야겠다고 했더니 자리 비우지 말고 그대로 앉아 일하라고 했단다. 그이가 겪었던 일은 시간이 흘러도 잔인하게 되풀이된다. 내 친구가 그랬던 18년 전과 똑같이, 그 친구가 일했던 자리, 청계천 평화시장의 1960~1970년대와 똑같이. 한 치 나아짐도 없이.
3년 전, 주중 시간외노동과 주말노동을 100시간 안짝으로 했던 그이는 이제 120시간을 훌쩍 넘겨 일한다. 그이를 일요일 저녁에 만났는데 퇴근하는 길이었다. 전날 토요일에도 일했다.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가능하면 일요일은 쉬고 싶다는 바람은 사치일까.
50대 중반 여성노동자의 하루는 출근해 최소 13시간 일하고 밤에 집에 와 쓰러져 자고 다시 다음날 일어나 일하는 생활이다. 쉴 틈도, 살림에 손 댈 겨를도, 가족들과 마주앉을 새도 없다. 자녀들이 20대라 밥은 먹었는지, 밤에 혼자 잘 있는지 애타지 않아도 되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이렇게 생산에 매진당한 노동자의 삶을, 누군가 찬양할까. 생산으로 얻은 이득은 이 노동자에게도 돌아갈까.
제조업에서 법이 무색하게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쓰는 게 일상이다. 시간외노동을 비롯해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노동자에게 ‘일만 하는 기계’로 살라고 강요하는 건 시대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 어디에선가 일할 내 친구는 32년 노동자, 그 세월을 인정받으며 살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