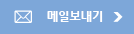국내정세(노동운동 동향) | [좋은 글]청춘을 다 바쳤다. 민주노조 사수하자! 무엇을 위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15 14:04 조회3,92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청춘을 다 바쳤다-스타케미컬.hwp
(3.1M)
25회 다운로드
DATE : 2015-06-15 14:04:43
청춘을 다 바쳤다-스타케미컬.hwp
(3.1M)
25회 다운로드
DATE : 2015-06-15 14:04:43
본문
매일노동뉴스에 연재되고 있는 김승호의 노동세상(6월 15일자) 글입니다.
청춘을 다 바쳤다. 민주노조 사수하자! 무엇을 위해?
김승호(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
지난 12일 오후 2시에서 저녁 늦게까지, 서울 남영역 인근 ‘슘’에서, 스타케미칼 해복투 투쟁기금 마련 후원주점 ‘연대의 밤’이 있었다. 이 행사의 구호는 “굴뚝의 봄, 연대의 힘으로!!”였다. 이 행사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스타케미칼 지회가 주최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장 지회의 해고자들의 “자주적” 단결체인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 주최한 것이었다. 경북 구미3공단에 위치하는 스타케미칼에서는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차광호 대표가 작년 5월27일에서 지금까지 일 년이 넘게 45미터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11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굴뚝이 보이는 공장 정문 앞 공터에서 천막을 치고 그와 함께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사람들은, 사회와 정치는, 언론은, 그리고 특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도 이 투쟁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굴뚝농성이 309일을 넘기고 310일이 되었을 때 ‘세계최장기 고공농성’이라며 진보언론들에서 잠시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1년을 넘겼을 때 “굴뚝 위 1년 ‘슬픈 신기록’ ... 최장 고공농성”이라며 조금 보도했다. 하기야 정리해고와 노조탄압에 저항하여 민주노조 활동가가 목숨을 바쳐도, 취직이 되지 않아 미혼의 세 자매가 집단자살을 해도, 세상은 이들의 아픔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스타케미칼 해고자들의 투쟁에는 슬픈 신기록만이 아니라 남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세상이, 특히 노동운동이, 이 투쟁에 주목하고 연대할 것을 촉구한다. 이 투쟁의 슬로건은 남다르다. “해고는 살인이다”가 아니라 “청춘을 다 바쳤다”가 그들의 구호다. “(해고자와 비 해고자가) 함께 살자”가 아니라 “민주노조 사수하자”가 이들의 구호다.
그 구호대로라면 이 동지들은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본이 복직시켜 준다 하더라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 동지들은 고용과 임금 같은 실리에 앞서 ‘우리들의 해방 터’인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고 외쳤던 선배 노동자들을 계승하고 있다. 이들에게 청춘을 다 바쳐 일구어온 그 민주노조가 없는 고용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운동 활동가들도 왕왕 이들이 무모한 투쟁, 비현실적인 투쟁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미 폐업을 결정한 회사에 공장 재가동을 요구하고, 복직을 요구하고, 민주노조 승계를 요구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는 현실적인가. 겉으로 그런 구호를 내걸지만 사실은 자신이 정리해고 되지 않는 것이나, 자신이 정규직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리해고제나 비정규직제도는 철폐되지 않았으나 완성차 공장들에서 실제로 정리해고자가 복직되기도 했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으니까.
그러면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은 현실적인가 비현실적인가. 독점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투쟁을 자신의 사활이 걸린 일로 보지 않는다. 심한 탄압으로 중소·영세 사업장에는 민주노조가 들어서지 못해도 독점대기업 정규직에게는 민주노조가 허용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이뤄지더라도 독점자본이 자신들에게는 함부로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반면에 총파업을 하더라도 총자본이 밀어붙이는 제도개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조합원과 나아가 활동가들까지 현실을 이처럼 몰사회적, 몰역사적으로 협소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총파업이 힘 있게 조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이 만들어 놓은 이런 핵심노동자-주변노동자로의 분할통치 체제에 길들여진 노동운동은 투쟁을 할 수도 없고 요구를 관철할 수도 없다. 현실적이라는 이름으로 독점자본이 허용하는 틀 안에서 요구하고 투쟁하는 것으로는 사회 양극화와 노동 안에서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다. 노동운동은 독점대사업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적 이익 보호 장치로 전락하고 노동운동은 무력화된다.
노동운동이 대의를 실리를 위한 명분용으로 소비할 때 실패는 예고되어 있다. 개발독재 시대에는 노동 안에서의 분열과 그에 따른 조직 노동자의 사적 이익과 사회의 대의 사이의 괴리가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디플로마트>(The Diplomat) 5월 27일자에서 스타케미칼 차광호 동지의 고공농성을 보도하면서 지적하고 있듯이, 탈산업화가 진행 중인 한국의 노동자들에게도 선진국의 경우처럼 노동 안에서의 그런 분열과 괴리가 이미 현실이 되어 있다.
스타케미칼 노동자들의 구호인 “청춘을 다 바쳤다. 민주노조 사수하자!”는 민주노조 사수해서 내 고용과 임금이라도 챙기자는 실리적 구호가 아니다. 민주노조를 사수해서 “이 차디찬 착취와 억압의 땅”(고무노동자 고 권미경 열사의 팔뚝 유서에서)을 모든 노동자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으로 바꾸자는 대의의 구호다. 변혁을 위한 진지를 지키자는 구호다. 노동운동이 더욱 힘 있게 이들과 연대해야 하는 이유다.
# 추가 설명
이 스타케미칼 해고자들은 5년의 투쟁 끝에 고용, 노조, 단협 3승계로 일하게 된 (구) 한국합섭 조합원들을 제외한 신규채용 노동자는 전원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스타케미칼 자본의 부당한 압박에 굴하지 않았다. 민주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비정규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정신이었다.
그것에 대한 자본의 응답이 위장폐업 협박과 권고사직 압박 및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였다. 이것들은 결국 (구) 한국합섬 출신 노동자들 가운데 자본에 굴종하지 않는 부분을 제거하고 나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공장을 가동하려는 책략이었다. 그러나 1년 반 동안에 걸친 해고노동자들(28명)의 투쟁으로 자본의 이 책략은 실패했다.
그러자 자본은 이제 공장을 분할 매각하여 이익을 보고 철수하려 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임금채권을 포기하고 채권단도 양보해서 워낙 싼 가격에 공장을 인수했으므로(399억 원) 기계와 고철과 땅(3만 평 이상)을 팔면 투자원금이 충분히 회수된다.
이런 먹튀 자본에 대해 차광호 해복투 대표를 비롯한 11명의 해고노동자들이 다시 1년을 넘게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일터를 지키고 해방터인 민주노조를 지켜야 하므로. 손해를 보더라도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노동자의 정신이므로.
<참고자료>
1. [The Diplomat]지 5월 27일자 영문 기사
This South Korean's High-Altitude Protest Just Broke a Record
Ja Gwang-ho’s chimney-top sit-in is the latest in a storied tradition of high-profile labor protests in South Korea.
By Steven Denney for The Diplomat
May 27, 2015
|
Ja Gwang-ho on day 318 of his protest. Image Credit: Twitter/ 차광호 (Ja Gwang-ho) |
“We are not machines!” (See the scene from A Single Spark, starting at around 4:20, of Jeon’s protest by self-immolation.)
Other forms of public protest include long-term occupations of recognizable landmarks: cranes, jumbotrons, and building rooftops. Though not nearly as eye-catching as protest by self-immolation, they are still highly visible, public protests against objectionable working conditions. And they persist today.
While the literature on protest and social movements has emphasized the institutional or structural factors of organized labor and collective action, too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cultural elements. Indeed, in order to understand labor in our post-industrial world, the cultural or expressive elements must be carefully and systematically studied. A relatively new focus in the literature on South Korea’s labor movement, this is precisely what professors Jennifer Chun and Judy Han, both of the University of Toronto, are doing. A presentation of their recent work was made at a recent workshop in Toronto.
While labor conditions are a far cry from what they were in the early years of South Korea’s highly compressed industrial development — thanks in large part to South Korea’s labor movement and the efforts of people like Jeon — laborers face a new sort of challenge: the downwards pressures of global capitalism and neoliberal reforms. Much like the rise of labor market “dualism” (a dwindling core and rising informal sector) in the traditionally union-strong countries of France and Germany (analyzed in a 2010 article by Bruno Palier and Kathleen Thelen), informal and precarious employment is on the rise in South Korea — but not without symbolic and highly visible resistance.
Enter Ja Gwang-ho.*
Kyunghyang Shinmun reported on Monday that, as of Tuesday, Ja holds the record for longest high-altitude sit-in protest. Since May 27, 2014 Ja has sat atop a chimney some 45 meters off the ground to protest what he sees as the unjust treatment of union workers at the now defunct Star Chemical, a provider of synthetic fibers. In 2007 the company went bankrupt and was bought out by Starplex. During acquisition negotiations, Starplex allegedly promised to (re)hire the 800 unionized employees. However, instead of hiring all of them, Starplex unilaterally moved to have 228 employees “voluntarily retire.” Twenty-eight of the 228 refused; they were subsequently fired. Eleven of these 28, including Ja, have continued to fight what they perceived to be an unjust move by Starplex. Ja, unlike the others, took his fight to new heights — literally.
Whether they will win the fight with their employer is yet to be seen. The Kyungyhang piece notes that the 28 former employees and Starplex have yet to reach a satisfactory resolution to the issue. For now, Ja remains atop his perch, continuing his symbolic protest.
*A previous version of this article misspelled Ja Gwang-ho’s surname.
2. 뉴스프로, 5월 30일자 기사([The Diplomat]지 5월 27일자 영문 기사 번역)
디플로마트, 스타 케미컬 노동자 차광호씨 고공 연좌농성 신기록
2015/05/30 10:39
디플로마트, 스타 케미컬 노동자 차광호씨 고공 연좌농성 신기록
–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자살,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
– 한국, 이미 세계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하향압력으로 노동시장 “이중화”
디플로마트는 27일 스타 케미컬 노동자 차광호씨의 굴뚝 고공연좌 농성을 소개하면서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노동 투쟁을 보도했다. 그러나 과거 산업화 초기의 노동운동과는 달리,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은 그 상징성과 가시적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기사는 전했다.
기사에서는 한국의 노동운동은 극적인 혹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 왔다고 보도하였다. 그 예로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자살을 소개하였다. 한국 산업화 초기의 노동착취, 빈약한 근로조건과 열악한 노동환경 및 권력의 노동자 탄압에 대한 저항과 대중적 시위가 강성을 이루던 시기에 노동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분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 노동탄압에 저항했으며 이러한 저항은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대중시위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디플로마트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대중에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고공 점거농성이 일반화되었으며, 또한 노동-사회운동의 흐름이 되었다고 보도한다. 기사에서는 과거의 노동을 조직화된 노동과 집단적인 행동의 제도적 혹은 구조적 요소들을 강조한 반면, 문화적-표현적 요소들은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못하고 간과하였음도 지적하였다.
초기 산업화 시기의 노동환경과 현재의 노동환경은 많이 다르다. 이는 전태일과 같은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 커다란 역할을 한 덕분임을 이 기사는 강조한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노동자들은 세계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구도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이 기사는 지적한다.
기사에서는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구조 속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의 미명하에 노동자들을 향한 “하향압력”을 받고 있으며, 또한 노동 고용시장의 “이중화”에 직면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기사는 한국도 이미 하향압력과 이중화로 인해 고용의 불안정성의 증가로 노동운동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한다. 그러나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저항이 없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노동자 차광호씨의 45m 높이의 굴뚝 위에서 벌이는 고공연좌농성이 그것이다. 차광호씨의 농성 시위는 그 가시적인 상징성이 크다고 디플로마트는 보도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디플로마트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This South Korean’s High-Altitude Protest Just Broke a Record
한국 고공 시위 신기록 세워
Ja Gwang-ho’s chimney-top sit-in is the latest in a storied tradition of high-profile labor protests in South Korea.
차광호씨의 굴뚝 꼭대기 농성은 주목을 많이 받는 한국 노동 투쟁 전통의 가장 최근 것이다.
By Steven Denney, May 27, 2015
Ja Gwang-ho on day 318 of his protest. Image Credit: Twitter/ 차광호 (Ja Gwang-ho)
318일 째 시위 중인 차광호씨


Dramatic public protest of worker repression is a well-known theme in the history of South Korea’s labor movement. One of the best known and dramatic of protests was, of course, Jeon Tae-il’s 1970 suicide by self-immolation. To protest highly exploitative working conditions in South Korean factories, particularly the conditions in the Seoul Peace Market, Jeon lit himself on fire and ran through the streets of Seoul shouting, “Comply with labor laws!” and “We are not machines!” (See the scene from A Single Spark, starting at around 4:20, of Jeon’s protest by self-immolation.)
노동자 탄압에 반한 극적인 대중 시위는 한국 노동운동사의 잘 알려진 주제이다. 가장 잘 알려지고 극적이었던 시위 중 하나는 물론 1970년 전태일이 분신자살한 일이었다. 착취가 심했던 한국 공장의 근로 환경, 특히 서울평화시장에서의 노동조건에 저항하기 위해 전 씨는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서울의 거리를 달리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다. (영화 이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장면, 전 씨의 분신 시위는 4분 20초에 시작)
Other forms of public protest include long-term occupations of recognizable landmarks: cranes, jumbotrons, and building rooftops. Though not nearly as eye-catching as protest by self-immolation, they are still highly visible, public protests against objectionable working conditions. And they persist today.
다른 형태의 대중 시위로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물들, 크레인, 전광판, 건물 꼭대기 등을 장기간 점거하는 것들도 있다. 분신자살 정도로 시선을 끌지는 않지만 이들은 문제가 되는 근로 조건에 반대하여 벌이는 상당히 가시적인 대중 시위가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시위는 계속된다.
While the literature on protest and social movements has emphasized the institutional or structural factors of organized labor and collective action, too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cultural elements. Indeed, in order to understand labor in our post-industrial world, the cultural or expressive elements must be carefully and systematically studied. A relatively new focus in the literature on South Korea’s labor movement, this is precisely what professors Jennifer Chun and Judy Han, both of the University of Toronto, are doing. A presentation of their recent work was made at a recent workshop in Toronto.
저항과 사회 운동에 관한 문서들이 조직화된 노동과 집단적 행동의 제도적 혹은 구조적 요소들을 강조해온 반면, 문화적 요소들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실제로 산업화 이후의 세계에서 노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혹은 표현적 요소들이 심도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연구 되어야만 한다. 한국의 노동운동에 관한 문헌에서 비교적 새로운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토론토 대학에 근무하는 제니퍼 천 교수와 주디 한 교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두 교수의 최근 연구 발표가 최근 토론토의 워크숍에서 있었다.
While labor conditions are a far cry from what they were in the early years of South Korea’s highly compressed industrial development — thanks in large part to South Korea’s labor movement and the efforts of people like Jeon — laborers face a new sort of challenge: the downwards pressures of global capitalism and neoliberal reforms. Much like the rise of labor market “dualism” (a dwindling core and rising informal sector) in the traditionally union-strong countries of France and Germany (analyzed in a 2010 article by Bruno Palier and Kathleen Thelen), informal and precarious employment is on the rise in South Korea — but not without symbolic and highly visible resistance.
노동 환경은 한국의 매우 압축된 산업개발 초기에 있었던 것과는 매우 다르지만 – 전태일과 같은 사람들의 노력과 한국의 노동 운동의 커다란 역할 덕분으로 – 노동자들은 세계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개혁의 하향 압력이라는 일종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전통적인 노조 강성 국가에서의 노동 시장 “이중화”(점점 줄어드는 핵심과 늘어나는 비공식 부문)의 부상(부르노 팔리에와 케서린 텔렌의 2010년 논문에 분석된 바와 같이)과 흡사하게 한국에서도 비공식 및 불안정한 고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상징적이고 매우 가시적인 저항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Kyunghyang Shinmun reported on Monday that, as of Tuesday, Ja holds the record for longest high-altitude sit-in protest. Since May 27, 2014 Ja has sat atop a chimney some 45 meters off the ground to protest what he sees as the unjust treatment of union workers at the now defunct Star Chemical, a provider of synthetic fibers. In 2007 the company went bankrupt and was bought out by Starplex. During acquisition negotiations, Starplex allegedly promised to (re)hire the 800 unionized employees. However, instead of hiring all of them, Starplex unilaterally moved to have 228 employees “voluntarily retire.” Twenty-eight of the 228 refused; they were subsequently fired. Eleven of these 28, including Ja, have continued to fight what they perceived to be an unjust move by Starplex. Ja, unlike the others, took his fight to new heights — literally.
경향신문은 화요일이면 차 씨가 최장기 고공 연좌농성기록을 보유하게 된다고 월요일 보도했다. 2014년 5월 27일 이후로 차 씨는 지금은 파산한 합성섬유 공급업체인 스타 케미컬의 노조원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여기며 이에 항의하기 위해 45m 높이의 굴뚝 꼭대기에서 농성을 해왔다. 2007년 이 회사는 파산했고 스타플렉스가 이를 사들였다. 인수 협상 기간 중 스타플렉스는 800명의 노조원 노동자들을 (재)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체 인원을 고용하는 대신에 스타플렉스는 일방적으로 228명의 직원을 “자진 퇴직” 시키기로 결정했다. 228명 중 28명은 이를 거부했고 그들은 그 후 해고됐다. 28명 중 차 씨를 포함한 11명은 스타플렉스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여기며 투쟁을 계속해왔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차 씨는 자신의 투쟁을 문자 그대로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렸다.
Whether they will win the fight with their employer is yet to be seen. The Kyungyhang piece notes that the 28 former employees and Starplex have yet to reach a satisfactory resolution to the issue. For now, Ja remains atop his perch, continuing his symbolic protest.
고용주와의 싸움에서 그들이 승리할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경향신문 기사는 28명의 전 노동자들과 스타플렉스는 그 문제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결안에 도달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현재도 차 씨는 자신의 상징적인 농성을 계속하면서 굴뚝 꼭대기에 남아있다.
3. 스타케미컬 해복투 소식, 굴뚝고공농성 1년을 넘기며..
굴뚝고공농성 1년을 넘기며..
해복투소식
2015/05/29 10:34
스타케미칼 굴뚝농성 1년을 넘기며..
먹튀자본의 자본파업 이후 멈춰선 공장에서 분할매각저지-고용승계쟁취-민주노조사수 투쟁을 전개한지 3년째이다. 그리고 해복투 대표인 차광호 동지의 굴뚝농성이 1년을 넘어섰다. 투쟁이 전개되던 2013년에는 자본과 그 하수인이 된 지회에 의해 떠나가는 조합원을 막기 위해 맞서야 했다. 지회의 어용행각을 저지하기 위해 공조직의 자정능력을 발휘해달라며 동분서주 뛰어야했다. 그렇게 1년 6개월을 뛰는 동안 조합원의 고용은 완전히 정리되고 지회는 그 위로금을 챙기고 유유히 떠났다. 2014년 5월, 스타케미칼 해고자들에 대해 애써 무관심함으로 일관되던 시간과 그 뒤를 잇는 고립감 그리고 자본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분할매각이 본격화 되려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굴뚝에 올랐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올랐다.
파산으로 시작되는 장기투쟁
스타케미칼의 전신 한국합섬은 2005년 경영진의 무리한 사업확장과 실패, 내부 횡령 등 부조리, 경영권 다툼, 화섬경기침체 등 총체적 위기속에 자금유동성 위기까지 겪는다. 금융권에서 대출한 운영자금 200억 원을 용역깡패 앞세운 인적구조조정에 투입한다. 이에 노동조합은 용역깡패를 몰아내는 등 강고한 투쟁으로 구조조정을 저지한다. 하지만 운영자금이 바닥난 공장은 파산으로 내몰린다.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려다 끝내 파산 난 것이다.
파산 난 공장을 지킨 것은 노동조합이었다.
조합원의 체불 된 임금, 퇴직금 등 300여 억 원과 공장재가동, 3승계(고용, 노조, 단협)를 요구하며 채권단을 상대로 투쟁에 나섰다. 주채권 은행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상대로 ‘정부가 책임져라’ ‘파산기업 공기업화하라’며 싸웠다. 싸울 상대가 없다며 그 누구도 희망적이지 않던 파산투쟁을 사회적 문제화시키며 대정부투쟁 한 것이다. 마침내 2010년 지회(지회장 홍기탁)와 선합의 등을 조건으로 산업은행은 인수대상자와 공장매각에 합의하였다. 이 인수자가 스타플렉스다. 멈춰선 한국합섬은 스타플렉스의 자회사 스타케미칼이 되었다. 지회가 조합원들과 함께 뭉치고 함께 싸우면 반드시 희망은 있다며 절망공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였다.
비정규직 전면 수용아니면 자본철수?!
스타케미칼로 사명이 바뀐 공장. 재가동 초기부터 김세권사장은 고용 승계하기로 한 100명의 조합원 외 추가 충원인원에 대해 비정규직 도입을 요구해 왔다. 2011년 4월 마침내 재가동하여 생산에 돌입하였다. 첫 임단협에서 지회는(지회장 이정훈) 현장인원T/O문제, 호봉문제 등 민감한 문제 등을 차기 집행부로 넘겼다. 지회가 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